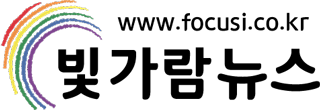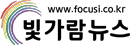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표시는 자율에 맡겨 등급제 무용론

[빛가람뉴스=조인호 기자] 돼지 등급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등급 판정 결과는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이로인해 생산자는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나지 않아 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보다는 등외 등급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66.3% 증가한 반면 돼지는 27.4%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지만 등급 표시 의무는 소에만 해당한다.
때문에 돼지는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는 큰 관련이 없다.
나아가 등급 판정 의무화로 실효성 없이 돼지 축산 농가에게 수수료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판정 총 수수료는 114억 7천만원이다.
그 중 돼지가 74억 2천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4%를 차지했다.
반면 소는 20억 2천만원, 그 외 축산물은 20억 3천만원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축평원이 징수하는 돼지등급 판정 수수료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기만한 채 수입을 충당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돼지등급제 시행 30년을 맞은 올해에도 어떠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등급 판정은 의무인 반면, 등급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등급 판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6개월 단기 비육사육 특성상 개체별 변별력과 품질 차별성이 미미함에도 등급을 나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